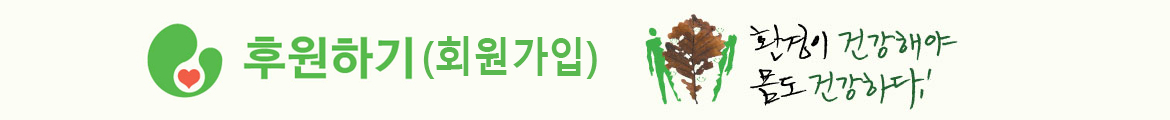‘탄소 월드컵’에서 무엇을 배울까
브라질은 축구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 온실가스 줄이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야심 찬 열대림 보호 정책을 폈다. 2004년 이후 8만6000㎢의 숲이 베어지는 것을 막았다. 축구장 1200만개가 들어가는, 거의 남한 면적이다. 베어낸 나무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숲을 보전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이중으로 나는 이유다. 소고기와 콩 생산을 늘리면서도 벌채를 70% 줄인 이 정책으로 브라질은 32억t의 온실가스 방출을 막았다. 미국의 모든 자동차를 1년 동안 운행정지시킨 것보다 3배 큰 효과다. 브라질 정부의 홍보자료가 아닌 권위 있는 학술저널 <사이언스> 최근호에 이런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
한창 달아오르는 이번 월드컵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브라질 월드컵은 역사상 지구에 가장 큰 탄소 발자국을 남긴 스포츠 이벤트가 될 것이다. 뜨거운 응원 열기가 지구를 데우지는 않는다. 누적해 수백억명이 지켜볼 텔레비전 때문에 전기 사용량은 늘 것이다. 2006 독일 월드컵 때는 결승전만도 지구인 9명 가운데 1명꼴인 7억명이 텔레비전으로 봤다.
최대 배출원은 따로 있다. 바로 항공 운송이다. 한국팀을 응원하러 인천공항에서 상파울루까지 왕복하면 1인당 9.2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온실가스 방출량은 휴대전화를 매일 1시간씩 1년 동안 통화하면 79㎏, 텔레비전을 1시간 틀면 88g이 나온다. 따라서 브라질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은 116년 동안 이렇게 통화하거나, 텔레비전을 수십만명(10만대)이 시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국제 스포츠 행사처럼 국제축구연맹(FIFA)은 ‘그린 월드컵’을 선포했다. 여기엔 ‘탄소 상쇄’ 계획도 들어 있다. 월드컵과 관련해 방출된 온실가스를 조림이나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줄여 기후변화 기여도 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연맹과 브라질 조직위원회가 여행과 숙박 등을 통해 배출한 25만여t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370만명에 이를 관중이 경기장에 오느라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운데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인 8만t만 상쇄해줄 뿐이다.
국제축구연맹이 자체 추정한 이번 월드컵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72만t이다. 이 가운데 국제 운송이 138만t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의 여러 도시에서 나눠 경기를 치르다 보니 도시 사이에 이동하는 거리도 최고 5000㎞에 이른다. 국내 운송 과정의 온실가스도 80만t으로 전체의 29.5%나 된다. 국내외 항공 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80%를 넘는다.
그린 월드컵의 효시인 2006년 독일월드컵 때 국내 수송의 74%를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로 해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외국에서 월드컵을 보러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환경 월드컵’이란 포장은 지나쳤다.
이번 대회 마스코트 풀레코를 보아도 그렇다. 사상 처음으로 토종 야생동물을 마스코트로 삼은 것까진 좋았다. 위기를 만나면 완벽한 공처럼 몸을 감는 이 건조림 아르마딜로는 안정성이 뛰어난 공인구 브라주카를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멸종위기인 아르마딜로를 보전하기 위해 월드컵에서 한 골이 들어갈 때마다 10㎢씩 보호구역으로 만들자는 시민 캠페인은 조직위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을 뿐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한겨레신문 2014년 6월21일자 칼럼